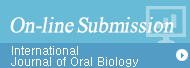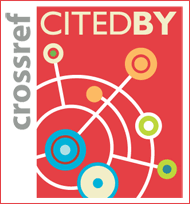Introduction
연하 작용은 입술, 혀, 후두, 인두 및 식도를 구성하는 근육 조직의 조 화로운 수축과 억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감각-운동 통합 행동이다. 연 하 과정은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중 구강- 인두 단계에서 인지되는 구심성 감각 입력은 연수의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 NTS)과 대뇌 운동 피질을 통해 연하 반사의 개시 와 이후의 연속 운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특히 연하 작용에서 용량의 영향은 다른 감각 자극보다 체계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용적과 비례하여 식도 괄약근의 움짐임 또한 커지고 반응 시간도 길 어지는 현상이 증명된 바 있다[2,3]. 이러한 감각 정보는 식괴(bolus)의 용량, 온도, 점조도, 질감, 맛 등이 조합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아직까지 모든 변수의 영향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진 않았다[4].
연하곤란(삼킴장애)은 뇌졸중 및 두경부암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영양 실조, 탈수, 흡인 등의 위험도가 높아 중요한 임상적 문 제로 간주된다. 연하곤란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감각 입력의 변화를 통 한 연하 조절 효과가 심도있게 분석되어 왔다. 그 중 온도의 영향으로 차가운 온도는 구강 인식을 증가시켜 구강 단계에서 인두 단계로 넘어 가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6]. 이와 유사하게, 온도 가 체온과 유사할 때는 연하 반사의 지연이 가장 컸으며, 체온보다 낮 거나 높을 때 가장 적었다[7]. 또한, 노인에서도 연하 작용이 둔화되는 특징을 보인다[4]. 건강인에서도 60세 이상부터 인두 삼키기의 개시 에 0.5–1초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 80세 이후에는 구강 단계의 근 육 운동도 느려진다[3,4]. 이에 부가적으로 노인에서는 안면부의 온도 감지 역치는 높아지고, 구강 내 부피 인식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8,9]. 이를 근거로 냉자극은 전신질환자나 노인과 같은 연하곤란 환자의 보조적 치료로서 “온도-촉각 구강 자극(thermal-tactile oral stimulation)”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10,11].
하지만 아직까지 온도에 의한 연하 작용의 변화가 구강 내 용량 인지 민감도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구강 내 부피 인식의 변화에 대한 온도 감각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구강 내 감각 정보 와 연하 작용 간의 관련 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성인에서 냉온, 상온, 온온의 세 가지 온도 변화를 통해 구강 내 용량 변화를 인지하는 민감도가 온도에 의해 영향 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Subjects
피험자는 20–3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남자 5명, 평균 연령 = 27.7 ± 4.29세, 범위 23–35세; 여자 5명, 평균 연령 = 24.3 ± 2.26세, 범위 20–30세). 이번 연구는 본 실험에 앞서 유의한 결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피험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므로 최소화된 인원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의 학생 또는 직 원이었다. 지원자 중에서 구강 내 현격한 구조 및 기능적 이상이 있거나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모든 신경 이상, 연하곤란 및 연하와 미각에 이상 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복용 중인 자는 제외되었다[9]. 모든 참가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서면 동 의를 거쳐 실험에 참여했으며, 이번 연구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기관 심의위원회(KNUDH-2024-07-02-00)의 승인을 받았다.
2. Liquid
각각 5, 10, 15, 20, 25 mL의 용량으로 소분한 증류수를 반투명한 플라스틱 계량 컵에 담아 제공하였다. 모든 용액은 실험이 수행되기 3 시간 전부터 4℃ (냉온), 21℃ (상온), 45℃ (온온)로 설정된 냉·온유지 기 안에서 보관되었다[5,12]. 냉·온유지기는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되고, 설정온도에서 2℃ 상승 또는 하강 시에 재작동을 반복하므로 보관 용액의 온도 유지가 용이했다. 한 편 구강 점막 세포 손상의 임계 온도는 60℃ 정도이므로 본 연구는 피 험자 보호를 위해 점막 손상이 유발되지 않는 안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다[13].
3. Experimental condition
실험은 외부 자극을 최소화시킨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내에서 수행되 었다(실내온도 약 21℃; 습도 약 40–50%; 조도 약 600 lx) [14]. 피험 자는 공간 중앙에 배치된 테이블과 안락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 에서 실험에 참여했다.
4. Subjects instruction and procedure
피험자는 실험 시작 30분 전부터 물을 제외한 음료와 음식의 섭취 및 흡연이 금지되었고, 실험 15분 전에 실험 장소에 도착하여 실험실 환 경에 적응했다[14]. 이 때 실험의 진행 과정에 대해 교육 받고 3회의 사 전 연습이 선행되었다[9]. 실험 중 피험자의 시각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눈가리개를 사용했다[15]. 또한 손을 통한 중량 감각을 최소화하기 위 해 면장갑을 착용했다[16]. 피험자의 손에 컵이 전달되면 안에 담긴 용 액을 모두 입 안에 넣었고, 5초 후 전부 뱉도록 하였다[12,17]. 뱉고 난 뒤에는 눈가리개를 벗고 가능한 즉시 인지된 용량 정도를 100 mm 시 각아날로그척도 자(visual analogue scale ruler, VAS ruler) 위에 표 시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자유로운 응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추 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 눈금이나 숫자가 표시되지 않은 VAS ruler를 사용하였다[18]. 각각의 머금음 사이에는 최소 15초 이상의 간 격을 가졌으며, 각 용량마다 2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했다[9,17]. 3회의 사전 연습에서는 모든 피험자에게 21℃의 증 류수 5, 15, 20 mL가 같은 순서로 제공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언제나 21℃ 용액으로 시작하여 10회의 각 용량이 무작위 순서로 제공되었다. 이후 4℃와 45℃의 순서는 온도 영향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 무작위 규 칙을 따랐으며, 각 온도 간의 적용 간격은 최소 60초 이상이었다[14]. 총 30회의 측정이 한 날에 모두 완료되었으며, 전체 실험 시간은 대기 시간을 포함해 30분 미만으로 소요되었다. 실험은 한 사람의 실험자에 의해 진행되어 가능한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다.
5. Data and statistics
온도별 각 용량에 대해 측정한 2회의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했 다. 실험에 사용된 다섯 가지의 객관적 용량을 x축에, 주관적으로 인지 된 용량의 평균값을 y축에 나타냈을 때 얻어지는 추세선의 기울기 값을 산출하여 이를 각 피험자의 온도 당 최종 데이터 값으로 사용했다[9]. 각 온도 그룹 간 용량 인지의 민감도(기울기 값) 차이를 Friedman 검정 으로 비교했다.
Results
각 피험자에서 지각된 용량 추세선의 평균 기울기 값은 4℃에서 2.140 ± 0.976, 21℃에서 2.264 ± 0.854, 45℃에서 2.176 ± 0.817로서 온도 조건 간 용량 인지 민감도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378) (Table 1).
Discussion
연하 반사는 구강과 인두 주변의 감각 피드백을 통해 조절된다[1]. 연 하곤란 환자의 재활 치료에 감각 조절 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있어 다양 한 감각 자극의 효과는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19]. 그동안 부피, 미각, 온도, 점조도, 진동, 탄산화 등의 영향이 평가되어 왔으며[5,19- 21]. 그 중에서 촉각의 일종인 부피 감각은 인지된 용량과 비례하여 연 하 촉발 시간은 단축되고 근육 움직임은 증가되는 가장 밀접한 연관성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수용 영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더 큰 용량의 식괴가 NTS 내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더 많은 수의 감각 섬유를 흥분시켜 운동 뉴런의 활성을 증폭시키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9].
온도 자극은 구인두의 감각 민감성을 높이고, 삼킴 반사를 변화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약 8–10℃의 차가운 물과 58–60℃의 뜨 거운 물을 건강한 성인에게 마시게 했을 때, 23–25℃의 상온의 물보다 인두 삼킴 반응 유발 시간이 짧아졌다[6]. 또한, 건강인에서 구인두의 냉자극 시 연하와 관련된 대뇌 피질 활성화가 확인되었다[22,23]. 임상 에서 온도-촉각 구강 자극은 약 90여 년 전부터 삼킴 반사의 유발 속도 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0]. 다만 뜨거운 물 을 삼키는 것은 연하곤란 환자에게 시도되지 않으며, 차가운 금속 막대 나 후두 거울을 이용해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또는 식사 전과 중간에 자 극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된다[24].
그러나 실제 연하 운동은 단일 감각이 아닌 온도와 촉각, 미각 등의 다양하게 조합된 감각 정보를 통해 조절되기 때문에 여러 감각 요인 간 의 상호 효과에 대한 확립이 중요하다. 온도는 맛, 촉감과 같은 구강 내 의 여러 감각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예를 들어, 차가 운 음식이 더 짜게 느껴지는 현상은 짠 맛을 감지하는 상피 나트륨 이온 통로(epithelial sodium channel, ENaC)가 저온에서 더욱 활성화되 는 기전으로 나타난다[26]. 또한 건강인에서 혀의 표면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진동 인식 민감도와 점조도 식별 능력이 더욱 강화된다[15]. 그 러나 아직까지 구강 내 용량 인지 민감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확인되 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액체의 온도가 용량을 인지하는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결과 온도 변화가 용량 인지 민감도에 미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냉온, 상온, 온온 모두에서 용량 변화에 대한 비례적인 인지 민감도를 보였다(Fig. 1). 즉, 건강인에서는 온도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액 체의 부피를 감지한다고 할 수 있다.
식괴의 용량은 연하 운동의 중요한 조절자로서 다른 감각 변수에 비 해 양적으로도 더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다[9]. 연하에서 용량의 특성은 저작을 거치고 타액과 혼합되면서 실시간으로 재구성되는 복잡성을 가 진다[27]. 이러한 용량 변화를 인지하는 민감도는 생리적 노화에 따라 감소하고, 이는 노인에서 용량 변화에 대한 감각능력 저하가 폐로의 흡 입(aspiration)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9]. 다른 연구에서는 삼킴 을 촉발하는 최대 용량의 역치 또한 젊은 피험자에 비해 노인에서 높았 으며 삼킴 역치 용량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8]. 이는 용량을 인지하는 복잡한 생체역학적 조절 기전에서 온도 요인의 기여도가 노화의 영향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 구강 내 감각 요인 간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 기 위해 액체의 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손에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비록 기존 연구에서는 구강 내 액체 온도의 감지를 보다 정확 하게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실험 설계에서 액체가 입으로 들어가기 전 의 온도와 뱉은 직후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기 때문에 손에 의한 체온의 전도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게와 용량에 대한 구강 지각이 Stevens [29]의 정신물리학 법칙을 따르는 것을 감안하여 구강 자극에 앞서 손을 통해 인지되는 온도와 무게 감각 이 구강 지각에 미칠 수 있는 심리-생리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장갑을 착용하였다[30].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도에 따른 연하 작용의 운동 변화까지는 평가하지 않았으며, 온도와 부피 감각이라는 두 가지 요소 간의 연관성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비교적 젊은 피험자를 대상 으로 하였기에 노인에서의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 서는 노화 및 온도 인지 민감도 차이에 따른 용량 인지 민감도가 직접적 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교적 작은 표본 수로 인해 성별 등에 따른 온도의 세부적인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요소의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온도에 따라서 구강 내 용량 인지 민감도의 변 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온도가 용량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젊고 건강한 피 험자에서는 용량 인지 민감도가 온도 조건에 관계 없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